간화선이 화두를 사유하는 수행인가?
페이지 정보
4,219 2015.09.19 08:37
본문
간화선이 화두를 사유하는 수행인가?
[기고] 현응 스님의 <깨달음과 역사~> 반론
"화두를 사유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쉬웠겠나
무상 연민 자비행 품고 의심하는 게 화두”
2015년 09월 18일 (금) 11:15:28 오용석 중국 남경대 철학박사 dasan2580@gmail.com
현응 스님은 지난 5월 20일 <법보신문>에 내놓은 기고문에서 ‘출가승단은 불교자본가’라는 표현으로 불교계에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생사의 해탈과 중생에 대한 자비행을 목적으로 한 출가가 ‘자본가’와 연결된다는 상상력은 그동안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다. 자본가는 노동자와 상대적인 말로서 경제적 위계와 차별적 질서를 암시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의 수행 공동체인 승가, 그리고 승가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승려가 어떻게 ‘자본가’가 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현응 스님의 발언은 한국 불교의 현주소 혹은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 우려와 종단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일부 승려들의 개인적인 관점일 수 있다는 정도로 보고 싶다. 불법이 존속되는 한 출가 수행자의 목적은 대승적 정신을 기반으로 삶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고통에 대한 해결을 해 나가는 성스러운 삶의 실천가이자 모범이라는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대승불교의 출가자는 개인의 해탈 뿐 아니라 내가 아닌 타자에 대한 연민과 뜨거운 감수성을 이타행으로 실천해 나가는 보살도의 실천자이기에 승속을 막론하고 육바라밀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대승의 이념이 ‘불교자본가’라는 관점에 의하여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응 스님은 다시 <깨달음과 역사 그 이후>의 전문에서 많은 논제를 제시하였다. 발언한 내용 자체가 학술적인 글이 아니기에 필자 역시 논거 보다는 논지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대승불교를 바탕으로 선사상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간화선을 전공하였다.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각계의 전문가들에게 미루고 현응 스님의 간화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불교는 심오하지만 난해한 교리를 전개하는 학자들의 불교가 되고 말았다. 보다 대중적인 불교도 필요했을 것이다.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인도인들의 용어들과 개념, 게다가 번역된 한문 자체가 어려운 문자였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불교경전들과 주석서는 불교이해의 큰 장벽이었다.
마침내 '불립문자(不立文字)''직지인심(直指人心)''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선불교의 슬로건이 등장했다.
현응 스님은 위의 글에서 불교 이해의 큰 장벽이 불립문자의 선으로 발전하게 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선불교는 당시 교학불교의 주된 흐름이었던 화엄종, 천태종 등과 같이 발전하였으며, 당시 정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교학불교가 회창법난(842~845)을 통하여 쇠퇴하고 난 후에 중국 불교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선불교의 등장은 당시의 정치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학불교가 가진 정치적 성향과 지적(知的)이해의 한계를 직접적인 수행과 삶 속에서 극복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불교의 등장을 교학불교와의 배타적 관계로만 이해하는 것은 선불교 사상을 이해하는데 온전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당송대의 선어록을 보더라도 많은 선사들이 화엄과 천태 등의 교학 체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간화선과 관련된 현응 스님의 글을 살펴보자.
결국 간화선은 조사스님들의 설법이야기나 주고받은 대화들을 잘 기억하였다가 수시로 사유하는 수행이다. 책이 필요 없는 공부방법이기도 하다. 번역된 그 어려운 한문불경을 탐독할 필요가 없다. 책이 필요 없는 불교는 그 자체로 자유로운 면이 있다. 홀홀단신 떠돌아다니는 운수납자(雲水衲子)라는 자유로운 출가수행자상은 중국에서 이때 비로소 출현한 것이 아닐까 싶다.
위의 간화선과 관련된 글은 현응 스님의 사띠에 대한 이해와 함께한다. 현응 스님은 “‘잘 기억하여 그 내용을 사유하는 일’을 경전에서는 ‘사띠(念, 憶念)’라 표현했다. 사띠의 사전적 의미는 ‘기억’이다. 8정도의 정념(正念)도 바로 이 사띠이다. 이때의 인도는 아직 기록문화가 생기기 전이며, 종이도 책도 없었다. 기록이 없던 시대에 공부하는 방법은 사띠(기억하여 사유함) 외엔 달리 없었을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사띠’를 ‘기억’의 의미로만 해석하고 있는데 ‘기억’은 ‘사띠’의 여러 의미 가운데에 한 가지에 해당할 뿐이라는 것을 언급해 두고 싶다. 현응 스님은 이러한 ‘기억’의 의미로서의 ‘사띠’를 “간화선은 조사스님들의 설법이야기나 주고받은 대화들을 잘 기억하였다가 수시로 사유하는 수행이다.”; “이런 선불교의 간화선은 인도의 사띠 수행의 중국적 변용이라 할 것이다. 다만 같은 점은 사띠든 간화선이든 둘 다 설법내용이나 대화를 늘 기억하여 성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로 표현하면서 간화선과 관련시키고 있다. ‘사띠’를 ‘기억’의 의미로 해석하는 근거를 ‘기록이 없던 시대에 공부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는데, 이 말은 인도의 경우에는 해당이 될지 모르나 간화선이 유행하였던 중국의 송대는 해당되지 않는다. 송대는 이와 반대로 엄청난 기록 문화의 시대였다. 송대 문화사를 살펴보면 당시 인쇄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의 관계가 밀접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록문화가 발달하였던 송대에 ‘잘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필자가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간화선을 ‘수시로 사유하는 수행’으로 단정하는 부분이다. 물론 불교는 인간의 사유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 연기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유 혹은 마음의 활동은 우리 삶의 실존적 모습이기 때문이다. 현응 스님이 말하는 ‘사유’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이해가 결국 ‘이해하는 깨달음’의 논의로 귀결되는 것을 본다면 ‘지적 통찰’에 가까울 것이다. 왜냐하면 사유는 결국 지적 통찰 혹은 이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유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유에 동원되는 언어 자체가 가진 실체성의 문제와 관계가 깊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비트겐슈타인, 라캉 등과 같은 현대철학자들에 의하여 깊이 논의된 문제이기에 생략하고자 한다. 간단히 말하면 사유가 가진 한계는 그것 자체가 유아론(唯我論)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언어의 실체화와 관련된 문제는 일찍이 용수가
[기고] 현응 스님의 <깨달음과 역사~> 반론
"화두를 사유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쉬웠겠나
무상 연민 자비행 품고 의심하는 게 화두”
2015년 09월 18일 (금) 11:15:28 오용석 중국 남경대 철학박사 dasan2580@gmail.com
현응 스님은 지난 5월 20일 <법보신문>에 내놓은 기고문에서 ‘출가승단은 불교자본가’라는 표현으로 불교계에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생사의 해탈과 중생에 대한 자비행을 목적으로 한 출가가 ‘자본가’와 연결된다는 상상력은 그동안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다. 자본가는 노동자와 상대적인 말로서 경제적 위계와 차별적 질서를 암시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의 수행 공동체인 승가, 그리고 승가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승려가 어떻게 ‘자본가’가 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현응 스님의 발언은 한국 불교의 현주소 혹은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 우려와 종단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일부 승려들의 개인적인 관점일 수 있다는 정도로 보고 싶다. 불법이 존속되는 한 출가 수행자의 목적은 대승적 정신을 기반으로 삶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고통에 대한 해결을 해 나가는 성스러운 삶의 실천가이자 모범이라는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대승불교의 출가자는 개인의 해탈 뿐 아니라 내가 아닌 타자에 대한 연민과 뜨거운 감수성을 이타행으로 실천해 나가는 보살도의 실천자이기에 승속을 막론하고 육바라밀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대승의 이념이 ‘불교자본가’라는 관점에 의하여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응 스님은 다시 <깨달음과 역사 그 이후>의 전문에서 많은 논제를 제시하였다. 발언한 내용 자체가 학술적인 글이 아니기에 필자 역시 논거 보다는 논지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대승불교를 바탕으로 선사상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간화선을 전공하였다.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각계의 전문가들에게 미루고 현응 스님의 간화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불교는 심오하지만 난해한 교리를 전개하는 학자들의 불교가 되고 말았다. 보다 대중적인 불교도 필요했을 것이다.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인도인들의 용어들과 개념, 게다가 번역된 한문 자체가 어려운 문자였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불교경전들과 주석서는 불교이해의 큰 장벽이었다.
마침내 '불립문자(不立文字)''직지인심(直指人心)''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선불교의 슬로건이 등장했다.
현응 스님은 위의 글에서 불교 이해의 큰 장벽이 불립문자의 선으로 발전하게 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선불교는 당시 교학불교의 주된 흐름이었던 화엄종, 천태종 등과 같이 발전하였으며, 당시 정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교학불교가 회창법난(842~845)을 통하여 쇠퇴하고 난 후에 중국 불교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선불교의 등장은 당시의 정치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학불교가 가진 정치적 성향과 지적(知的)이해의 한계를 직접적인 수행과 삶 속에서 극복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불교의 등장을 교학불교와의 배타적 관계로만 이해하는 것은 선불교 사상을 이해하는데 온전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당송대의 선어록을 보더라도 많은 선사들이 화엄과 천태 등의 교학 체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간화선과 관련된 현응 스님의 글을 살펴보자.
결국 간화선은 조사스님들의 설법이야기나 주고받은 대화들을 잘 기억하였다가 수시로 사유하는 수행이다. 책이 필요 없는 공부방법이기도 하다. 번역된 그 어려운 한문불경을 탐독할 필요가 없다. 책이 필요 없는 불교는 그 자체로 자유로운 면이 있다. 홀홀단신 떠돌아다니는 운수납자(雲水衲子)라는 자유로운 출가수행자상은 중국에서 이때 비로소 출현한 것이 아닐까 싶다.
위의 간화선과 관련된 글은 현응 스님의 사띠에 대한 이해와 함께한다. 현응 스님은 “‘잘 기억하여 그 내용을 사유하는 일’을 경전에서는 ‘사띠(念, 憶念)’라 표현했다. 사띠의 사전적 의미는 ‘기억’이다. 8정도의 정념(正念)도 바로 이 사띠이다. 이때의 인도는 아직 기록문화가 생기기 전이며, 종이도 책도 없었다. 기록이 없던 시대에 공부하는 방법은 사띠(기억하여 사유함) 외엔 달리 없었을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사띠’를 ‘기억’의 의미로만 해석하고 있는데 ‘기억’은 ‘사띠’의 여러 의미 가운데에 한 가지에 해당할 뿐이라는 것을 언급해 두고 싶다. 현응 스님은 이러한 ‘기억’의 의미로서의 ‘사띠’를 “간화선은 조사스님들의 설법이야기나 주고받은 대화들을 잘 기억하였다가 수시로 사유하는 수행이다.”; “이런 선불교의 간화선은 인도의 사띠 수행의 중국적 변용이라 할 것이다. 다만 같은 점은 사띠든 간화선이든 둘 다 설법내용이나 대화를 늘 기억하여 성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로 표현하면서 간화선과 관련시키고 있다. ‘사띠’를 ‘기억’의 의미로 해석하는 근거를 ‘기록이 없던 시대에 공부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는데, 이 말은 인도의 경우에는 해당이 될지 모르나 간화선이 유행하였던 중국의 송대는 해당되지 않는다. 송대는 이와 반대로 엄청난 기록 문화의 시대였다. 송대 문화사를 살펴보면 당시 인쇄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의 관계가 밀접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록문화가 발달하였던 송대에 ‘잘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필자가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간화선을 ‘수시로 사유하는 수행’으로 단정하는 부분이다. 물론 불교는 인간의 사유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 연기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유 혹은 마음의 활동은 우리 삶의 실존적 모습이기 때문이다. 현응 스님이 말하는 ‘사유’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이해가 결국 ‘이해하는 깨달음’의 논의로 귀결되는 것을 본다면 ‘지적 통찰’에 가까울 것이다. 왜냐하면 사유는 결국 지적 통찰 혹은 이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유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유에 동원되는 언어 자체가 가진 실체성의 문제와 관계가 깊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비트겐슈타인, 라캉 등과 같은 현대철학자들에 의하여 깊이 논의된 문제이기에 생략하고자 한다. 간단히 말하면 사유가 가진 한계는 그것 자체가 유아론(唯我論)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언어의 실체화와 관련된 문제는 일찍이 용수가
-
아난존자의 일기-2권
그러나 그날은 그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긴 이들은 모조리 밖으로 나와서 모여들었다. 우리…
위리야 2025-04-10 17:48 1 -
약사진언644
개경게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여래진실의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위리야 2025-04-10 17:41 1 -
금강진언343
개경게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여래진실의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
위리야 2025-04-10 17:41 1 -
츰부다라니342
츰부 츰부 츰츰부 아가셔츰부 바결랍츰부 암발랍츰부 비라츰부 발졀랍츰부 아루가츰부 담뭐츰부살…
위리야 2025-04-10 17:40 1 -
신묘장구대다라니345
신묘장구대다라니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알약 바로기제 새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하 사다바야…
위리야 2025-04-10 17:40 1 -
귀한진언-14
데 야타 옴 베칸제 베칸제 마하 베칸제 란자사몽 카퉈쉐야-
위리야 2025-04-10 17:39 1 -
아난존자의 일기-2권
그러나 이러한 일을 부처님께서 먼저 끄집어내시는 일은 결코 없었다.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
위리야 2025-04-08 14:11 1 -
약사진언643
개경게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여래진실의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위리야 2025-04-08 13:52 53 -
금강진언342
개경게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여래진실의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
위리야 2025-04-08 13:13 59 -
츰부다라니341
츰부 츰부 츰츰부 아가셔츰부 바결랍츰부 암발랍츰부 비라츰부 발졀랍츰부 아루가츰부 담뭐츰부살…
위리야 2025-04-08 13:13 49
-
지전보살님 드뎌 발원하셨군요 위리야88 2023-04-14 13:40
-
처처에 걸려들지 않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리야 2020-06-23 14:57
-
소중한 법문 감사합니다. 위리야 2020-05-15 11:47
-
구례 또 가야죠꽃 멀미를 하러 츠얼츠얼 내려가렵니다. 처멸 2020-02-02 15:12
-
와하 신용카드로 공중전화를 정말 대단합니다. 처멸 2020-02-02 15:11
-
저는 귀일심원 요익중생 상구보리하화중생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겠습니다. 위리야 2020-01-29 11:17
-
화살속도속에 시간을 건져가며 살아가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건만,그렇게 살아가시는 님이 계시… 향원 2019-12-17 17:41
-
이제 인연이 되는것이겠지요~ 부처님 말씀이 이세상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단비가 되어 삶의 무… 향원 2019-09-13 03:58
-
32분이 다가오는 구랴 보살님아 위리야 2018-06-12 16:45
-
일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시간도 조금 밖에 안걸리는데 왜이리 인연 닿기 힘들까요?우리는 … 위리야 2018-03-01 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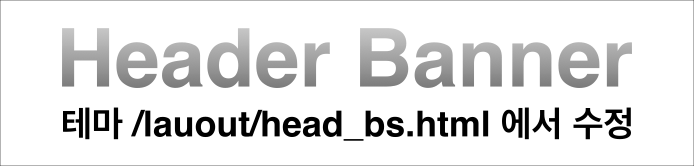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검색
월간베스트
악동뮤지션 이찬혁의 위엄.jpg아이폰싸게사는법0611g4x3kk6do5qu239ri4gx8…
아름다운강 2018-06-11 16:13죄송합니다.참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새삼 느낌니다.이제 저희 홈페이…
최고관리자 2019-07-27 21:16“ 문수보살 탱화조성 및 점안 봉행불사 ” 문수보살님이 계신 곳을 장엄하고 예경하는 마음…
smchang 2021-04-05 01:47인디언 명언에 보면, 만번을 말하면 현실이 된다고 했다.아마도 만 번을 말하다보면 자기 자…
smchang 2015-04-15 08:58이곳은 가능하면 경일암 소식과는 구분해서 자유로운 이야기들을 올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
smchang 2015-04-12 09:45